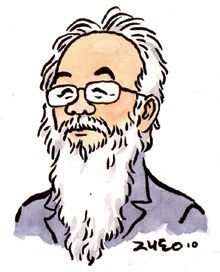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길을찾아서] 농민운동 함께해 즐거웠던 ‘장계’시절 / 문정현 | |
|
문정현-길 위의 신부 29
| |
 기사등록 : 2010-07-08 오후 07:41:28 기사등록 : 2010-07-08 오후 07:41:28 |
|
1985년 나는 전주 중앙성당에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성당으로 부임했다. 장계성당은 한국전쟁 때 외국에서 들어온 구호물자로 지은 곳으로, 당시 신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제법 큰 성당이었다. 소속된 공소가 7개였는데 1800년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신자들의 마을이 많았다. 전통적인 농촌 본당이다 보니 신자들은 대부분 구릿빛 얼굴에 살 한 점 없고, 몸은 오직 근육과 뼈뿐이었다. 눈 뜨면 밭에 나가고 때 되면 밥 먹고 또 뙤약볕에 나가서 자기 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게 농민의 삶이었다. 영성체를 받으러 나온 농민들의 손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다. 손가락이 제대로 다 있는 사람이 몇 안 됐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중지가 비뚤어지고 없었다. 다쳐도 제때 치료를 못해 그런 것이니 마음이 찢어졌다. 그래도 농부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 농사는 창조적인 일이다. 봄에 죽어 있는 것 같은 씨앗을 심어서 키워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는 일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농사는 하느님의 신비였다. 그래서 그때 농민들은 당당했다.
장계본당에는 이미 79년부터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11명 정도 있었다. 76년 함평고구마 피해보상운동과 78·79년의 노풍 피해보상운동, 오원춘 사건 등을 거치며 농촌문제에 눈이 뜨인 농민들이었다. 5·18 광주항쟁 때는 다른 신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나 역시 중앙성당에 있을 때부터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서로 마음이 맞았다. 본당 사목회 회원들은 85년 소값 피해보상운동, 88년 천마벼 피해보상운동, 부당조세 시정운동 등을 하면서 역경과 고통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피로 맺은 관계와 같았다.
장계성당 부임 초기 교우들과 가깝게 지내도록 도와준 분은 어머니였다. 그때도 어머니가 사제관에서 밥을 해주셨는데 성당에 딸린 밭에다 도라지·더덕·고추·호박 따위를 심고 가꾸며 늘 큰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언제 어디서 손님이 찾아오거나, 농민회가 시위라도 끝내고 허기져 돌아오면 수십명의 밥을 해냈다. 본당 신자들은 내가 없어도 어머니한테 가서 “밥 좀 주세요” 하고 끼니를 때웠고, 사제관은 마을의 사랑방처럼 붐볐다. 천천면 쪽에는 물이 맑고 깨끗한 개울이 있었다. 한여름 주일 오후 어린이 미사가 끝나면 누구라도 “천렵 가자” 소리치면 투망이나 낚시도구를 가기고 다들 냇가로 나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냄비와 양념을 가지고 오셔서 불만 피우면 매운탕을 끓일 수 있게 해주셨다. 고기를 잡으면 잡는 대로,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냇가에 앉아서 소박한 성찬을 즐기며 술도 마셨다.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놀 때도 같이 놀고 그야말로 혼연일체였다.
한번은 농민회에 기금이 부족해 투쟁자금을 마련하려고 소를 50만원에 사서 잡았다. 소를 도살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니 성당 마당에서 밀도살을 한 셈이었다. 그런데 소를 해체해 팔려고 하니 돈 될 만한 부위는 얼마 안 됐다. 좋은 부위는 전주로 나가 팔아 투쟁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큰 가마솥에다 끓여 잔치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즐거운 시절이었다. 농민회 투쟁도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덕분에 더 활기를 띠었다.
정부는 78년 무렵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의 간선도로 주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기와로 바꾸라고 강요했다. 장계지역을 지나는 도로가 관광도로여서 장계성당 신자들도 700만원을 강제로 대출받아서 정부가 설계한 기와집을 지어야 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보증을 세워야 하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보증을 했다. 문제는 빚이 300만원만 연체되면 다른 영농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빚이 쌓여도 농민들은 도망을 갈 수도 없었다. 자기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을 서준 이웃까지 애먼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었다. 정부 시책이라고 억지로 따르다 보면 전부 빚쟁이가 되는 판국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또다른 일은 정부에서 이미 잠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상태에서 뽕나무 묘목을 강제로 농민들에게 분양을 한 것이다. 있는 뽕나무도 뽑아야 할 판국에 면장은 위에서 강요를 하니 억지로 농민들에게 팔고, 농민들은 면장님 얼굴 보고 억지로 사야 했다. 농민들은 그 뽕나무 묘목을 말려서 불쏘시개로 썼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 ||||||||||||||||||||